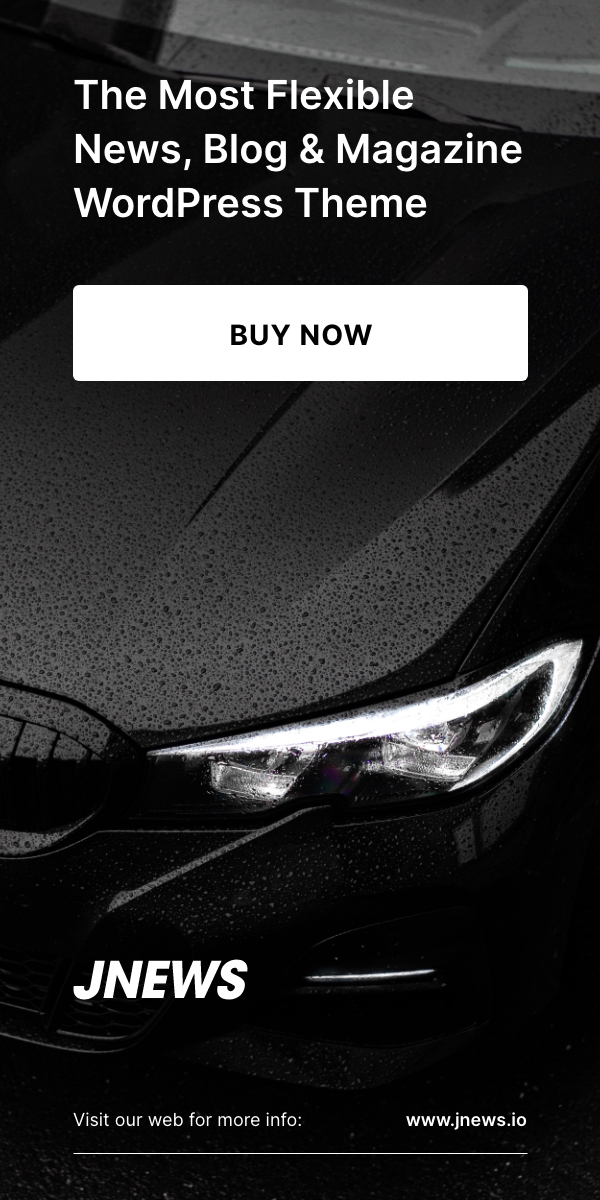여래장사상의 성립과 사상적 의의
조선시대에는 『기신론』과 『능엄경』이 불교 강원(講院)의 사교과(四敎科) 수업 과목이 되어 꾸준히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다소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여래장사상 연구자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원효이다. 이 46종의 문헌 중 40종이 신라인 찬술 여래장계 경전주석서이며, 고려시대에 2종, 조선시대에 4종이 있었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래장사상이 신라 때에 집중적으로 편중 연구되고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선과 고려는 특정 문헌에 한하여 여래장사상이라는 사상성을 벗어난 채 연구되었을 뿐이다.
- 따라서 이 시대에 대승불교도가 그 사상을 교의화하려고 할 때 많든 적든 바라문교(Brahmanism)의 자아 철학( tman-vidy )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진여와 여래장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지닌 참된 상태이며, 부처의 원천이며, 깨달음의 근거이다.
- 여래장은 실천적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이것을 존재론적 입장에서 취급하게 되면, 여래장과 알라야식의 결합이 문제시된다.
- 그래서 화엄경(徵塵含千喩)이 여래장사상의 선구도 되는 것이다.
- 자체는 본래적으로 깨끗한 마음인 자성청정심이고 다만 밖으로부터 번뇌로 더럽혀져 있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땡감(깨닫기 전의 뇌의 구조나 기능)이나 단감(깨달은 후의 뇌의 구조나 기능)이나 모두 감(뇌의 구조나 기능)이다. 같은 감이라고 하는 본성(本性,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단어)으로는 불이(不異)이며 떫고 달다는 위상(位相, 뇌의 구조나 기능이 달라진 점)으로는 불일(不一)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체론적으로 표현되거나 오해되고 있는 측면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연기.무아.공과 여래장이 사실은 한 목소리(一音)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짙푸른 감을 잘 가꾸면 가을에는 짙붉은 감이 될 것이다. 떫고 짙푸른 감(땡감)이나 달고 짙붉은 감(단감)이나 모두 감이다. 같은 감이라고 하는 본성(本性)으로는 불이(不異)이며 떫고 달다는 위상(位相)으로는 불일(不一)이다.
원효는 법장보다 앞서서 중국 및 한국, 일본의 여래장사상 전개에 선구적 구실을 담당하였고, 이 지역의 대승불교의 새로운 맥락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던 최초의 학자이기도 하다. 전자는 주로 중국의 화엄종(華嚴宗) 계통에서 사용된다. 이 의미에서 마음은 사물과 구별되는 마음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물이나 마음도 포함한 것이므로, 진여(眞如)와 같은 말이다. 먼저 이 교수님의 설명을 따르자면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이란 과(果)로서의 여래장을 설명하는 측면이기에 여래장이 연기와 공임을 설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여래장이라 불린 인간은 이렇게 부처와 중생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여래장의 개념에는 애시당초 절대불변의 실체라는 관념은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려면, 번뇌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측면은 말해져서 안 되기 때문이다.
본지 2336호(6월20일자) 수미산정에 실린 각묵스님의 ‘현양매구(懸羊賣狗)’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 본지에 ‘각묵스님의 현양매구를 읽고’라는 주제로 반론문을 보내왔다. ‘신라불교 여래장 사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여래장 학설을 연구하는 불교학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현실의 체는 진여이나 깨달아져 있지 않을 뿐이다. 현실에서 보면 현실과 진여는 다르나 진여쪽에서 보면 진여와 현실은 다르지 않다.
대승불교에서의 여래장사상 성립과 사상적 의의
하지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소위 ‘비판불교’는 여래장의 이러한 전통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아트만론과 유사하다는 측면만 부각하여 ‘여래장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기신론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청정심과 염오심을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중생심을 크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 진여문의 진여심(眞如心)을 여래장이라 하고 생멸문의 생멸심(生滅心)을 아뢰야식이라 부르고 있다. 진여인 여래장은 무어라 말할수 없는 자리이지만 굳이 분별을 해 본다면, 공여래장(空如來藏)과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의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 佛 敎 ♣ > 불교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러므로 만일 여래장이 마음이라 한다면 여래장은 무상이요 고요 무아다. 그런데도 만일 오온 외에(非卽非離蘊) 일심이나 여래장이 따로 있다 한다면 이것은 불교의 근본원리에 어긋나는 상식 이하의 유치한 외도적 발상이며 현양매구일 뿐이다. 만일 여래장이 자아라고 하면 그것은 즉시 외도의 가르침이 되는 줄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천창 교수의 고백처럼 상주불변하는 여래장과 영원, 상주, 부동, 불변, 태고인 자아(自我)의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늘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초기.부파.대승의 어느 시대의 불교를 막론하고 연기와 무아를 변함없는 진리로 섬긴다.
계(dha︣tu)란 경계에 의해 구분된 일정한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역시 여래의 본질(性)을 말한다. 그래서 화엄경(徵塵含千喩)이 여래장사상의 선구도 되는 것이다. 여래장은 본질적으로 불성(佛性) 또는 진여(眞如)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것은 인간의 성불할 수 있는 본성을 말하는데, 특히 번뇌로 덮여 있을 때 여래장이라고 한다. 범부에게 있어서는 여래장은 非顯在的이지만, 그래도 역시 실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여래장의 先在性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마음이 미혹에 빠져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래장연기가 설해진다.
이것은 여래장 삼부경이라 일컬어지는 『여래장경』 『부증불감경』 『승만경』 등에서 그 사상이 성립되고 『구경일승보성론』에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들 경론에서는 해탈의 주체인 마음을 고찰하여 중생과 여래가 동일함을 강조하고, 성불의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 그리고 그 동일성의 근거로서 법신편만(法身扁滿), 진여평등(眞如平等), https://kampo-view.com/ko-kr 여래성(如來性) 등을 제시하여 ‘일체중생유여래장(一切衆生有如來藏)’을 주장한다. 여래장 사상은 유식설 속에서 그 체계가 조직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사상(空思想)의 방편설이라 간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래장사상인 독립된 학파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중관(中觀)을 잇는 하나의 독립된 제3의 학파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래장사상은 대승의 궁극적인 진리인 空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공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이후에만 『능엄경』이 여래장사상 연구의 중심이 된 것은 신라 당시에는 『능엄경』을 신라인들이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기와 공이란 존재란 서로서로 조건 되어 생멸하고 있고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그것이 마음이라 불리어지고 여래장이라 불리어지더라도 서로서로 조건 되어 있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연기와 공이란 그 어떤 실체도 발 붙일 수 없는 철두철미한 언어이다. ‘마음’을 연구하고 있는 정신과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여래장 사상’에 대하여 외람되게 필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일체 중생 중 불법을 듣고 발심하는 자는 모두 보살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모두 여래의 가족이며, 여래의 자식이다. 이러한 입장은 여래장 사상에서 더욱 현저한데 여래장 사상에서는 종성이라는 개념을 모두 확산시켜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의 종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이 여래장 사상은 일체 중생에게 모두 예외없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래장사상의 가장 중요한 논서로서 평가받고 있는 『보성론』에 대한 원효의 관심이다. 『보성론』은 원효 이전 중국의 그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원효 이후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논서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스스로 중생세계에만 집착하는 현실고착을 타파시키고, 부처를 향하여 저 높은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를 위하여 당시 여래장 사상이 성립하였던 시기의 힌두교 사상으로부터 많은 표현들이 차용되었던 것 같다. 또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실제로 여래장 사상을 실체론으로 오해했던 사례 역시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은 오온의 하나의 구성요소이며, 오온은 무상이요 고요 무아요 조건발생(緣起)이라는 것은 불교의 상식중의 상식이다.
중생계와 법계가 같다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우리들 속에서 무량한 번뇌에 덮혀있는 여래이어야 할 본질 또는 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객진번뇌(客塵煩惱)에 덮혀 있는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다. 그 이후부터 밀교가 훙륭하는 6, 7세기 무렵까지 성립된 경전을 임시로 ‘중기 대승 경전’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초기 경전이 종교문학적인 것에 비해 중기 경전은 교의적 요소가 많다는 점이 특색이다. 소승불교에서 그 교의는 아비달마(Abhidharma, 論)라 불리는 문헌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심을 하기 위해서 먼저 즐거이 진여법을 생각하고, 무량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항상 공경 공양하며 삼보께 귀의하는 등 네가지 신심(四信)을 일으킬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심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止觀)등의 수행(五行)을 닦음으로써 일어난다. 그런데 스스로 근기가 하열하다고 생각하는 중생에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량없는 무량수 무량광이신 아미타불 즉, 자신의 여래장청정법신불을 항상 예념할 것을 일러주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범부(凡夫)의 마음은 미혹(迷惑)과 더러움에 뒤덮여 있지만 본성은 청정하여(自性淸淨心), 수행에 의해 청정한 본성을 전부 나타낸 것이 여래라고 역설한다. 이처럼 인간의 미혹과 깨달음, 일상심(日常心)과 여래장의 관계를 역설한 것이 여래장연기설(如來藏緣起說)이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지대한 영향 하에 놓여온 한국불교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신론의 여래장사상에 입각한 수행법으로는 발심(發心)을 들고 있으며, 발심을 위해 신심(信心)을 일으킬 것을 권하고 있다. 나아가 진여 법성에 수순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해행발심(解行發心)이 있고, 그리하여 진여법신지(眞如法身智)를 체득하여 만덕을 구현하는 자연업의 증발심(證發心)을 시설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다. 여래장(如來藏) 또는 불성(佛性)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일부학자는 왜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가.